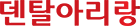작년 학생회장으로 활동할 때의 일이다. 2017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개교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학생 활동 부분을 맡게 됐다. 1967년 개교한 이래 역대 학생회 활동 기록, 각 동아리별 역사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옛날 기록들을 들춰보며 예상치 못했던 잔잔한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난다.
마이크를 잡고 강의하는 모습이 익숙한 교수님들의 성함을 과거 학생회장, 총무부장, 특활부장, 또 동아리 회장 등 역대 임원진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점잖으신 지금의 모습과 달리 몇몇 분들의 과거 풋풋했던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며 소리 죽여 웃기도 했다.
또 요즘과는 다른 옛날 치과대학생들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다. 과거 8기 학생활동 기록 중, “유신정권의 야외집회 불허를 피해, 몰래 밤섬에서 모여 과일주와 음식을 먹으며 강변 나뭇가지에 시를 걸어 시화전을 열었다”는 대목에서는 옛날 대학생활의 낭만을 느낄 수 있었다.
매년 6·9제 성적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종합 우승을 목표로 했다 아쉽게 석패했다’, ‘숙원이었던 종합 우승을 거두었다’는 언급이 매 기수마다 꼭 들어가 있던 것이다. 모든 운동부원의 사기를 위해 전교생이 돈을 갹출해 전달했다는 기록도 요즘 학생들이 들으면 어리둥절할 부분이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도 인상적이었다. 운동권 대학문화가 주류를 이룰 때에는 활동 내용이 주로 대정부 투쟁, 대학 본부와의 단과대학 승격 투쟁, 치과병원 건립 투쟁, 직선제, 학원 민주화 등에 대한 기술이었던 탓이다.
각 동아리별 연혁에서는 평소 궁금했던 동아리 이름의 유래 역시 찾아 볼 수 있었다. 역사가 길지만 지금은 명맥이 사라진 동아리도 있었고 최근에 만들어진 동아리도 있었지만, 동아리 역사와 현황이 학생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며, 역시 치과대학의 학생 활동이 동아리 중심이라는 점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과거 기록이라 해도 사관이 동행하는 조선 왕조 실록이 아니나 25주년, 30주년을 기념해 그 시대에 적합하게 재편집된 기록들이 대부분이었다. 각각 편집된 시점마다의 강조점도 다르고, 특색 역시 다를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라고 불리는 이유일까. 이번 50주년 기념 책자의 특징은, 대학의 영역이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 유수의 치과대학들과의 교류 활동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훗날 70주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후배들은 어떤 기분으로 50주년 책자를 읽게 될지도 궁금해졌다.
오래 전(?) 학부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한참을 돌아 치전원에 들어올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사라지다시피 한 동아리 문화가 아직도 건재한 부분이 신기하기도 했고, 역시 없어져버린 도제식 문화 역시 속으로는 불만이기도 했다.
전국 11개 모든 치과대학에서 선후배 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꼰대 문화나 쓸데없는 위계 놀이는 아닐 것이다. 물론 2017년도에 맞지 않는 상황을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될 때는 갑갑하기도 하다. 선배라면 위계를 앞세우며 자기 것만 챙기기 전에 먼저, 후배와 후학들을 위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최선의 전략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을 과거에 먼저 갔던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경험, 그것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이고 선학들에게서 이어져온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이 이번 개교 50주년 행사를 지켜보며 얻은 나름의 성과였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학병원이나 상급 병원에서, 또는 주변의 작지만 큰 자신의 의원에서, 또 연구와 교육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치과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든든한 마음이 든다. 원내생으로서 생경한 병원 생활에 숨이 차면서도 한편으로 모든 치과의사가 겪었던 과정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힘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