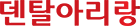이해범 대표
리윈드 치과 컨설팅 그룹

얼마 전 함께 프로젝트를 하는 원장님과 점심을 한 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다. 이야기의 주제는 당연히 병원 경영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원장님은 CS적인 차원에서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본인만큼 환자들에게 공감하지 못해서 환자들의 만족도도 낮다고 느끼고 답답하다는 내용이었다.
이 이야기에, 이 글을 읽는 많은 원장님들이 ‘공감’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공감’이라는 단어는 참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어려운 단어이다.
만약 위의 환자의 이야기에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직원에게 “왜? 공감하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저는 공감해주고 있는데요?”라고 말할 것이다. 공감을 한다? 공감을 못한다?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오래된 연구 결과이긴 하다만, 1984년 미국의 의사인 하워드 베크만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의료 상담 기록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 했다.

모든 대화는 의사가 환자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무려 70%가 넘는 경우 환자가 말을 시작한지 20초도 되지 않아 의사는 말을 끊고 진단을 내리기 시작했다. 환자가 본인의 불편함과 어려움, 생각을 끝까지 이야기한 것은 채 2%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15년 후, 하워드 베크만은 같은 병원에서 같은 연구를 다시 반복하였고, 의사들이 같은 비율로 여전히 굉장히 빠르게 환자들의 이야기를 끊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그렇다고 환자들의 하소연을 계속 그냥 듣고만 있으면 공감을 잘 하는 것인가? 공감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능력’이라는 말이다. 결국엔 이 공감이라는 분야는 객관화 할 수 없는 분야인 것이다.
객관화 할 수 없는 분야에서 객관성을 찾는 방법은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치과에 오는 환자들이 ‘다산콜센터 120’처럼 세상의 모든 분야의 질문을 하고 민원을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에 치과에 찾아오는 환자들은 특정한 주소를 가지고 찾아온다.
오늘 치과의 모든 직원들과 다같이 한 번 앉아서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환자들에게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작은 차이로, 작은 말 한마디로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공감’이라는 가치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