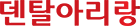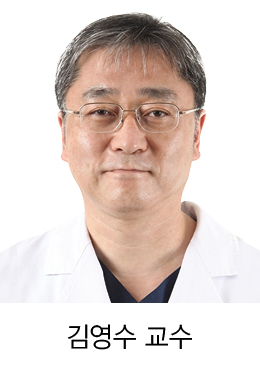
필자가 근무하던 의료원 부속 대학원에서 학생을 지도할 때로, 모 과(某 科)의 대학원생의 논문 통계 부분을 지도할 때의 일로 기억된다.
잠을 설치면서까지 통계분석을 해 주었는데, 논문 발표 시에 필자가 지도한 대로 발표를 하지 않아 발표장에서 강하게 질책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필자는 대학원 논문 질(質)의 향상을 위해 그리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해당 대학원생은, 결국 필자의 못된 성격(?)을 잘 알고 계신 담당지도교수에게 불려가서 호되게 지적을 받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본인의 연구실로 사과(?)를 하러 찾아왔다. 그 전날 필자 본인이 심하지 않았을까 밤새 자성(?)하고 있었는데, 마침 아침 일찍 사과하러 찾아온, 이제 젊은 봉직의(pay-doctor)로서 바쁘게 지내고 있던 대학원생은 사과하러 왔다는 말을 전했다.
그 순간 대학원생이 입술을 지그시 깨무는 모습을 필자가 보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를 보는 순간 필자는 해당 선생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읽고 말았다. 더 이상의 논쟁 내지는 언어의 폭력(?)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기에 ‘잘 알겠다.’고 대답하고 해당 대학원생의 진료 시작 시각 걱정을 하며 돌려보냈다.
그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지나가는 말로 필자에게 ‘문제의 초점’을 알려 주었다. “대학원생의 논문 지도에서 통계 부분만 해결해 주면 되지, 왜 학생을 가르치려 하느냐?”는 것이었다. 아주 간단한 요구사항을 필자는 확대 해석한 것이다. 공부 잘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치과의사로 성장한, 선배 교수의 지도학생을 필자가 ‘무자비하게’ 지적을 하면서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마음을 모두 상하게 한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 본인이 근무했던 대학원에서는 서서히 필자에게 ‘통계’ 분야에 대한 자문이나 지도를 부탁하는 일이 적어졌고, 결과적으로 필자의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많아져서, 오히려 외부 대학의 통계학 강의나 학회 모임, 교재 출판의 여유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다.
필자는 ‘통계학’ 분야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학을 전공하는 자연과학대학 교수나 타 의과대학에서 보건통계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가끔 필자를 불러 학회에도 참석시키고, 지도학생 논문 심사도 의뢰하곤 했다.
부족한 필자가 통계학을 배울 수 있었던 계기는 지금은 돌아가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문혁수 교수님’과 치과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문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발령을 받을 즈음에 필자는 서울치대 예방치과 조교로 근무하면서 해당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문 교수님께는 ‘생물통계학’이라는 과목으로 한 학기 강의를 들었던 게 전부였던 것 같다. 그 이후 예방치과 교실에서 자주 만나뵙는 문 교수님께 이것저것 궁금했던 통계학 내용을 물어보면, 문 교수님의 대답은 반 이상은 농담조로 필자에게 들렸다. “김 선생, 다른 사람이 그걸 모르면 이해되지만 김 선생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그 대답을 듣고는 소심한 필자는 한동안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존심 상한 얼굴을 보이면, 문교수님이 지으시는 미소는 필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 날 밤부터는 모든 향응(?)을 전폐하고 통계학 관련 서적을 구해 이리저리 펼쳐 보았던 것 같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럭저럭 2-3년이 지나, 필자보다 1년 선배들이나 동기들의 논문 작성 과정에 통계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필자를 후배 조교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앞으로 ‘통계학’ 강의를 해도 되겠다고 필자를 추켜세웠을 때, 문교수님께 얼마나 속으로 감사했는지 모른다.

근무했던 의료원 부설대학원에서, 필자는 돌아가신 문교수님이 필자에게 해 주셨던 스타일대로 지도를 했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공급자’는 아니었던 것이다. 해당 지도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친절하게 ‘정답’을 적어주어야지, 왜 과정을 설명하면서 ‘언어 폭력’을 범하는지를 따져 물었던 것이라고 회상한다.
필자의 세대에서는 ‘선배의 놀림 섞인 자존심 긁기’가 ‘면학의 동기’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세대는 대부분(?) ‘부모의 싫은 소리도 별로 듣지 못했던 모범생 후배’들인 것이다. ‘결과’가 필요하면 ‘결과’를 가르쳐 주면 되는 것이고, ‘과정을 궁금해하는’ 후학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만 ‘과정’을 알려 주면 되는 것이다.
보건소에 근무한지 2개월이 지났다. 일주일 중 하루 오전은 ‘튼튼이 교실’이라는 걸 개설하여, 유치원생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시키고, 전문가 불소도포를 해 준다. 담당 치과위생사로부터 2개월간의 필자 근무 기간 중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한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치과의사인 필자가 구강검사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 그 이후 package로 진행되는 ‘금연교육’ 등이 늦어지게 되고, 유치원에 돌아가는 귀원 시간에 차질이 오니 구강검사 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한다.
20년 정도 전에 필자와 당시 치과대학 및 치과위생과 교수들이 ‘구강보건협회’에서 밤늦도록 회의하면서 만든 교육 자료를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귀에 익숙했던 사업이 ‘튼튼이 교실’이다. 필자는 이곳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만나 너무나 반갑고, 없던 애정도 생겨, 아이들이 오면 유니트 체어도 태워(?) 주고, 이닦기나 구강 상태를 일일이 평가해 주며, 유치원 선생님들의 사진 촬영 시간도 할애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별 불만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소모하면서 필자 혼자만 뿌듯해 했던 것 같다.
우리는 각종 회의에서 ‘튼튼이 사업’과 같은 보건소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획에 참여를 하여 일선 보건소에 내려 보내고는 마땅히 훌륭한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일선 보건소에서 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은 유치원 측의 협조를 얻어야 적절한 사업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공중구강보건사업으로 ‘튼튼이교실’이 있다면, 보건소 공중보건사업으로 ‘아토피 예방’이나 ‘금연교육’과 같은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일선 유치원에서는 한 번 보건소 방문할 때 이 모든 프로그램을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소화(?)하는 것이 편하다는 당연한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들을 안전하게 유치원으로 이동시켜 귀가시켜야 하는 일도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개선 요청사항을 청취한 후부터는 할 수 없이 아동들을 한 명씩 유니트 체어에 앉히고 그 상태 그대로 구강검사 후, 신속하게 챠트에 메모하고 나서 모든 원아의 구강검사가 끝난 후, 결과지를 필자가 직접 적어서 유치원 선생님께 전해 주었다.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40년이 지난 치과의사에게 검진 속도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필자가 고안한 간이 구강진료 기록부에 메모 후 집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나이 탓일 것이다.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 본연의 장점이 필자로 인해 소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일일이 모든 유아를 사진 찍는 유치원 선생님이 더 바빠진 건 어쩔 수 없는 부작용(?)으로 간주하더라도.
장기를 두고 있는 노인 분들의 장기판을 지나가던 나그네가 잠깐 보고 함부로 훈수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판이 어찌 흘러갈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튼튼이 교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후,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이를 건의하기로 하고, 조금 참고 지켜보기로 했다. 필자의 세대는 과정을 중시했기에, ‘통계학’ 같은 학문도 후학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튼튼이 교실’ 같은 공중구강보건교육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좋은 구강관리습관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