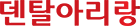의사들의 정부상대 두 번째 파업은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상대로 투쟁을 했던, 2013-2014년이었다. 이때 필자는 이미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로컬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공대생 신분이었던 2000년 의사 파업때와는 달리, 훨씬 더 직접적으로 의사들의 파업의 이유나 진행상황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2000년 파업때처럼 과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으려 한다. 이 글에서 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가치판단이 아니라,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도입 역시, 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의사단체들의 중의를 모아서 추진된 제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된 제도였다는 사실이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IT강국이자,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원격의료가 언젠가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감했다.
하지만, 2014년의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은, 올바른 제도 정착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건너뛰고, 의사 집단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되었던 기억이 있다. “영리병원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2000년처럼, 아니 그때보다도 오히려 무기력하게, 의사협회로 대표되는 의사단체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이다. 필자의 서울대 의대 동기인 지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인턴과 전공의들은, 의사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의료제도를 갑작스럽게 도입하려하는 정부를 상대로 얼마든지 파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나, 당시 의사 협회는 이러한 인턴과 전공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합의해버리고 말았다.
당시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조절해야 할 의사협회는, 그들 내부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해, 당시 의사협회를 이끌던 수장이던 노환규 회장이 중도 하차하는 등의 추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과 의사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할 전공의들의 파업의지와 열망은 한순간에 꺾이고 말았다.
그 당시의 필자처럼 의사협회로 대표되는 의사집단의 모래알 같은 응집력과 대정부투쟁에 있어서의 기대 이하의 협상능력을 경험한 의사들은, 정부와의 투쟁이나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밀리다가, 결국은 의료제도의 붕괴까지 이르게 됨을 예견했을지 모른다.
2014년 의사파업과 대정부투쟁이 얼마나 중구난방식으로 비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사진을 첨부하겠다. 이 사진은 지금도 필자에게는 처음으로 의사가 된 후, 경험하게 된 의사와 정부간의 투쟁에서 아프디 아픈 말 그래도 웃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진이다. 왜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투쟁에서 일방적으로 철저하게 패배했는지, 그 원인이 정부보다는 의사들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원인은 결코 앞으로도 극복되기 쉽지 않음을 철저히 깨닫게 된 2014년의 파업이었다.
2013년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의사 1만 8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당시 노환규 당시 의사협회 화장이 벌인 자해 소동 사진 : 그 의도는 좋았고, 분명 존경할만한 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효과와 결과를 가져오게 된 퍼포먼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