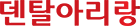이 때의 시위와 파업은 2024년 현재로서는 24년이나 지난, 꽤 오래 전의 일이지만, 2000년 당시 의대생이 아닌 공대생(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00학번)이었던 필자의 기억에도 꽤 강렬하게 남아있다. 당시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당시 갓, 서울대학교 의예과 1학년이었던 고등학교 친구들조차도 여러 차례 의사들의 시위에 동원되고, 왜 의약분업제도가 실시되면 안되는지에 대한 유인물 등을 서울대 관악 캠퍼스 내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여러차례 목격했을 정도로, 당시 의사들이 보여줬던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강렬했었다.
필자의 아버지 역시, 정형외과의 특성상 여름 휴가를 가더라도, 병원 문을 닫지 않고 명절이든, 일요일이든 365일 24시간 내내 병원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맞이하셨지만, 2000년 당시 개업 13년 만에 처음으로 병원문을 닫고, 입원 환자 이외에는 다른 진료를 하지 않는 모습을 아들로서 목격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입을 통해, 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지에 대한 의사의 입장을 아주 자세히,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었음은, 덤이었고 말이다.
물론, 필자가 이번 회차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했던 의사의 입장이나 의약분업제도가 과연 당시 의사들의 주장처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반의료적인 제도였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다. 그러한 얘기는, 조금만 검색을 해보아도, 인터넷 여기저기에서, 당시 신문기사나 전문가들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훨씬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필자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시 의사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을려고 했던 의약분업제도는 결국 약간의 수정이 있긴 했지만, 정부의 애초 뜻에 따라 결국 2000년 중반부터 시행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보험수가의 인상과 의대생수의 감소가 정부의 의지에 따라 동시에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앞선 편에서 필자가 말한 것처럼 의대생수의 증원을 의사 집단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의대생수의 감소를 첫 번째 요구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을 이 글을 읽는 치과의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의대생수 증가는, 국민 인구의 증가와 의료 접근성의 필요에 따라 80,90년대에 점차적으로 당연히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져왔고, 이 당시 의사집단은 그러한 의대생수의 증가에 대해 어떠한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다.
또한, 보험수가 역시, 수차례 물가상승률만도 못한 인상이 매해 이어지는 와중에도, 어떠한 반대 시위도 의사 집단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에 의약분업의 반대급부로 정부로부터 보여주기식의 1년에 무려 3차례의 보험수가의 인상 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나마 이 조차도 불과 1년 후인 2001년 의사들의 주장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이르자, 2000년 이전으로 원상복구 되었고 말이다.
물론 이때에도 의사 집단은 약간의 항의만 했을 뿐,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약분업제도의 실시가 과연 정당했는지, 그 결과가 국민건강이나 건강보험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필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아니, 적어도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가급적 언급하지 않으려한다.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의사들의 파업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의 ‘의약분업제도’ 실시로 인해 촉발된 의사들의 파업에서부터, 의사 집단은 정부에게 이기지 못했고, 오히려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져왔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을 뿐이다. 한마디로, 의사들은 2000년에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와 투쟁에서,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패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