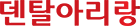한 시간에 걸친 설명이 끝나고 드디어 식사시간이다. 농장주인은 오렌지 말고도 포도밭을 하면서 직접 와인을 생산하기도 하는 네델란드계 후손인데, 자기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와인 테이스팅에는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적포도주인 Pino tage와 Sauvignon blanc이 나왔다. 저녁 메뉴로는 닭바베큐와 감자구이, 밥이 나왔는데, 모두들 내일부터 이어질 캠핑식 전의 마지막 호화판 디너로 생각했는지 잘들도 먹는다.
아침에 출발할 때만 해도 전부가 젊은 친구들이라 괜히 주책없이 캠핑여행에 뛰어들었나 걱정했는데, 하루를 함께 하다 보니까 나이를 뛰어넘어 금방 동료애가 형성된다.

늘 처음 만나면 그렇듯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뭘 하는지, 왜 이 여행을 왔는지 일상적인 것들을 묻고 하다 보니 금방 잘 시간이 됐다.
내일은 600 킬로미터를 달려야 하는 힘든 여정이다. 첫날 잠을 자야 할 텐데, 모두들 기대 반 우려 반 식당을 나서는데,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비친다. 바로 이것을 보러 온 것 아닌가. 모두들 잠자리에 들 생각은 안하고 별보기에 정신이 없다.

은하수가 보인다. 남반부에서도 은하수가 보이나?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 은하수란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보는 은하수이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가면 은하수를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어려서 별과 은하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나이 60이 훌쩍 넘어 남반부 끝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바라보는 은하수는 신비롭기 그지없었다.
사실 내가 해외학회에 갈 때마다 가급적 집사람을 동행하려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남편으로서의 사명감인데, 내 경험으로 아무리 좋은 데라도 한 번 가면 일부러 다시 가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같이 공유할 추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다고 놀려도 가급적 같이 간다.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어차피 호텔방은 얻는 건데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되니 돈이 더 많이 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잠자리가 예민해서 옆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니 호텔 방을 따로 얻느니 집사람과 함께 쓰는 게 경제적이다. 그런데 사실 더 이기적인 이유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집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보통 그룹여행보다는 개별 여행을 하면서 현지음식을 즐기는 편인데, 가끔 혼자서 여행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니자니 내가 먹고 싶은걸 못 먹어서 불편하고, 그렇다고 식당에서 혼자 밥 먹기도 그렇다. 캠핑여행이라고 시큰둥하던 집사람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아름다운 밤하늘 광경에 감복해 한다.

노곤한 일정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도중에 무릎이 시려서 잠을 깼다. 집사람은 잘도 자는데 도무지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히말라야 트래킹 때의 경험을 살려서 Nalgene 물통에 더운물을 받아서 안고 잤는데도 도저히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몸을 웅크려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겨우 선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들 추웠다고 난리들이다. 아침 기온이 섭씨 4도 까지 내려갔었단다. 특히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추웠던 적은 평생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떤다. 하긴 평생 난방장치라고는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테니 그럴 만도 하겠다.
그래도 우리 부부는 2월 한겨울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에서 슬리핑백 하나를 의지하고 히말라야 트래킹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까짓 추위쯤이야 했었는데, 왜 그렇게 추웠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날이 밝아 침낭을 점검해 보니 아뿔싸 마트에서 사온 침낭이 불량이다. 극세사 솜으로 만들어진 이름 있는 브랜드라서 아무 생각 없이 샀는데, 솜이 한쪽으로 뭉쳐 다른 쪽은 홑겹만 남은 것이다. 집사람 것은 옛날에 산 것인데도 다운 털이 아직도 촘촘하게 유지되는데, 아프리카를 우습게보고 ‘추워 봤자지’하고 가볍게 본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다시 살 수도 없는 일이고, 일단 사막으로 들어가면 저녁에도 그렇게 춥지는 않다고 해서 다음 날 부터는 가져간 다운 자켓을 침낭 속에 넣고 덮으니 훨씬 덜 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