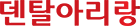“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멋지게 남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스포트라이트 여덟 번째 주인공 김미영 씨는 대전 에이스마일치과병원 데스크 실장을 맡고 있는 코디네이터다.
14년째 에이스마일치과병원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오랜 경력을 지닌 만큼 이곳에서는 ‘왕언니’로 통한다. 그렇게 맡언니로서 직원들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씨는 사실 처음부터 치과와 연을 맺은 건 아니다. 그는 공대를 나온 연구소 직원이었다. 대학 졸업 후 조교를 거쳐 연구소에서 지낸 그였지만 여성 차별이 만연하던 문화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자신이 없었다.
진로 고민에 빠진 그에게 때마침 사촌 언니가 병원 코디네이터를 제안했고 곧바로 서비스교육센터에 들어가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의 나이 27살 때다.
그가 코디네이터로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은 안과였다. 면접을 위해 찾은 그곳은 환자도 많고 직원도 많은 번듯한 안과였지만 직원을 대하는 원장의 태도에 입사를 포기했다.
“면접을 보는데 ‘바쁜데 귀찮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다 의자 등받이에 잔뜩 기대 누워 몇 가지 질문만 던졌죠”
김 씨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어린이 한의원이다. 그러나 177cm라는 큰 키가 어린이 환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일이 풀리지 않아 낙담하던 그가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바로 에이스마일치과병원이다. 김 씨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치과에 들어갔는데 원장님께서 환자를 모시러 나오고 계셨어요. 이어 저를 보시고 제게 인사하셨죠”
원장이 직접 환자를 맞이하는 모습은 그에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그렇게 면접을 보며 원장의 진료 철학에 매료됐고 2007년 8월 27일 에이스마일치과병원과 연을 맺었다.
공대 출신인 그에게 치과 일은 혹독했다. 그는 모든 게 낯설었고 그만큼 마음고생도 컸다 말했다.
“기초 임상부터 의학용어, 각종 프로그램, 데스크 업무까지 모든게 생소했어요. 실수가 잦아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어요”
자존감이 무너질 때마다 그를 지탱해준 건 다름 아닌 직원들의 응원과 환자들이 건넨 한마디였다.
“언제는 한 환자분이 ‘그래도 선생님이 계셔서 치과 다닐 맛 납니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코가 찡했죠. 사직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저를 생각해주는 환자를 생각하며 버텼죠”
김 씨는 ‘이가 아파서 오는 환자는 마음도 아프다’고 말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환자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숱한 좌절을 듣고 김 씨는 이제 인기강사라는 부캐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치과와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는 그는 앞으로 최장수 코디네이터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나이 먹으면 코디네이터를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멋지게 이겨내고 싶어요. 그 다음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를 위한 책 한 권 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