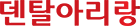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한마디 말로써 평생을 지키면서 행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때 공자가 한 답이 기소불욕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다.
즉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라는 뜻으로, 자기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논어(論語) 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오는 구절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마땅히 하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이다.
춘추전국시대 처세의 달인으로 알려진 귀곡자(鬼谷子)는 여기에 더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도 그에게 베풀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 정말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야말로 배려철학의 진수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행동보다 늘 말만 앞선다는 것인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어느새 나도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알아서 도와주고 진료실에서는 직원들이 입 안의 혀처럼 움직여주니 군대 말년 차가 되면 말뚝박고 싶다는 말처럼 모든 환경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 진료실에서도 게을러지고 이러한 게으름증이 집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모양이다.
식탁에 앉아서 손만 벌리고 숫갈줘 젓갈줘 하니 집사람이 참다못해 여기가 진료실야? 하고 퉁바리가 들어온다. 그야말로 내가하기 싫은 일만 골라서 남에게 시키는 ‘施於人(시어인)’의 표상이 됐다. 작년부터는 대오각성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집안 청소와 저녁식사 후 식기들을 디시워셔에 넣는 일은 내가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 진료실에서의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가 않는다. 사실은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자신을 변명한다. 내가 소독실에 들어가서 기구를 닦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레지던트들의 진료를 내가 어시스트 해줄 수도 없다고 말이다.
그런데 최근에 누구나 싫어하는데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
바로 환자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지금 막 환자를 보기 시작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힘드냐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나이가 들면서 일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차라리 말없이 치료만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치료하고 나면 레지덴트들과 직원들이 정해진 매뉴얼 대로 주의사항 주고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상화 되다 보니 생긴 귀차니즘이다.
그런데 가끔 기분이 내켜서 환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너무나 좋아한다. 특히 여러 가지의 치료 옵션이 있는 경우 나란히 앉아서 X-ray나 CT를 같이 보면서 장단점을 설명해 주면 레지던트나 직원들이 설명 하는 것 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환자만족도도 높다. 설명이 다 끝나고도 더 궁금한 것 없냐고 물으면 환자들은 거의 감동 수준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귀찮게 여겨지던 것이 나에게도 즐거움이 된다.
그러고 보면 꼭 거창한 일을 일컬어 ‘己所不欲勿施於人’은 아닌 것 같다.